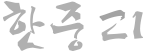오르고 또 오르고 싶은 게 사람이다.
위로, 위로 오르고만 싶다. 능력이 모자란 게 한(恨)일뿐이다.
그런데 묘한 게 오르고 올랐는데, 또 그 위에 뭔가가 있다.
이제 정상이다 싶었는데, 그 옆에 더 높은 봉우리가 나를 내려다본다.
“넌 아직 멀었어!”하듯.
그럴 때 정말 힘이 빠진다.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야 인생의 정상일까?’

맞다. 역시 답은 문제에 있다.
왜 모든 산의 정상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인생에는 정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 주변의 수많은 봉우리들을 보다 보면, 가소로운 게 바로 내 아래 것들이다.
내가 정말 죽을 둥 살 둥 기를 쓰고 여기까지 와서 보니
다시 더 높은 저 많은 봉우리들이 보이는데,
아직도 내 자리까지 올라오지도 못한 것들이 수없이 많다.
여기까지 올라온 내가 주변의 수많은 더 높은 봉우리들을 보면서
‘쉬면 안 되겠다. 다시 더 올라가자!’
다짐을 하는 데 아래 수많은 것들은 그저 틈만 나면 쉬려고만 한다.
아쉽고 아쉬운 게 아래 것들이다.
‘뭐 그래서 아래 것들이지 …’
하지만 얼마나 황당하고 철이 없는 생각인가.
자연을 관조하고 그에 비친 자신을 돌이켜 보면 자연히 반성을 하게 된다.
위가 뭔지 모르고 오르는
그 위가 끝이 없는 것이다.
아래가 뭔지 모르고 내려다만 보니
그 아래가 끝이 없는 것이다.
스스로의 갇혀 위만 보고 오르고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가련한 존재가
자신임을 알게 된다.
무엇을 왜 위라 하고, 무엇을 왜 아래 하는지도 모른 채 ….
한자의 위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정상이라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아니 그 기본인 ‘위’가 무언인지 알도록 해준다.

위라는 글자는 우리 생활 속에 일찌감치 등장했다.
갑골문자에서 위 상(上) 자는 아래 긴 선 위에 있는 짧은 선이다.
재미있는 것은 아래 선이 위로 오목하고 위의 선을 직선으로 짧아
마치 아래 선이 위의 선을 받쳐주는 듯하다.
뜻은 단순하다.
위는 아래위에 있는 것이다.
아래가 받쳐주지 않으면 위도 없다.
결국 위는 아래가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다.
‘아래’라는 것 위의 모든 것이 바로 ‘위’인 것이다.
이쯤에서 ‘위’가 무엇인지 대단히 명확해진다.
맨 아래만 알면 되는 것이다.
위의 기준이 되는 위의 맨 아래가 무엇인지만 알면, 위는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그 기준 위의 모든 것이 바로 위다.”
인생의 정상도 대단히 간단해진다.
인생 정상의 맨 아래가 무엇인지 알면
그 정상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다.
생의 정상은 그 정상의 맨 아래가 어딘지 알아야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이제야 아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같은 방식으로 아래 ‘하’(下)는 그런 소중한 아래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갑골문자의 아래 하는 위 ‘상’(上) 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아래로 오목한 윗선 아래 짧은 직선이 있는 모양이다.
역시 마치 위가 아래를 감싸듯 한 모양이다. 그 감싸는 선 밑의 모든 것이 바로 ‘아래’다.

아래를 제대로 알려면 역시 아래를 감싸고 있는 윗선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 윗선 아래의 모든 것 ‘아래’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위를 알아야 제대로 아래를 아는 것이다.
내가 지금 제 위치에 있는가?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
바로 내 아래를 보면 되는 것이다.
내 아래 무엇이 있는가?
답을 알면 절로 내 위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된다.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그 끝까지 가볼 것인가?”
갈까? 말까?
스스로가 안다. 유한의 시간을 사는 우리는 갈 수가 없다.
걸어오고, 걸어갈 길의 그 끝이 어딘지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의 생은 너무나 짧다.
어쩌면 우리가 가보지도,
가볼 수도 없는
이 길의 처음과 끝은 우리가 아는 그게 다인지 모른다.

아니,
우리가 알 필요 없다는 게 더 정확한 지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가고 가려는 길의 처음과 끝을 굳이 알 필요가 없다.
아래의 끝을 알 필요 없듯 위의 끝도 알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던져진 존재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무한의 길을 잠시 걷는 유한의 과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존재를 성찰하면 내 인생의 정상을 알고,
남 인생의 정상이 부럽지 않다.
나보다 높다고 한들,
그저 모두가 기준의 위에 있는 것일 뿐이다.
성긴 하늘 그물코의 무수한 별들이 모두 빛을 내듯
그리 빛나는 존재들이다.
아니 그 잠시의 빛에 불과한지도 모른다.